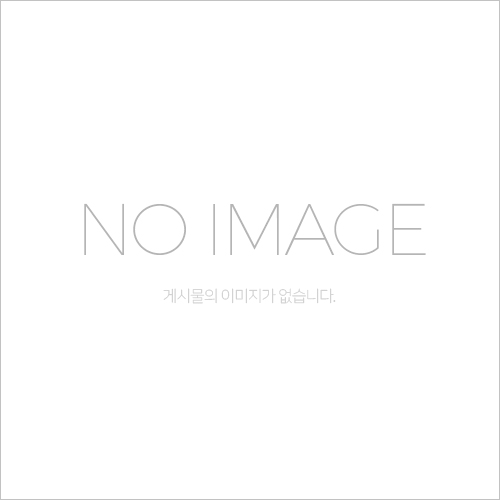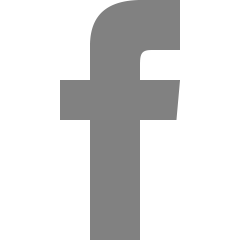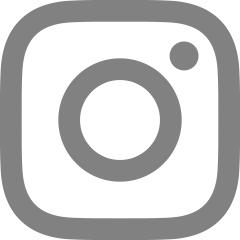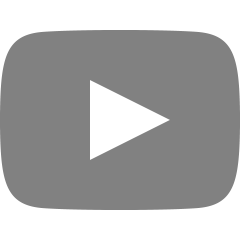거미 - 1,300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내게 되어 그 마음을 전하는 일이 더는 불가능해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물을 향한 자유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그는 이제 그 불가능이라는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므로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한평생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므로, 자유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작성하는데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은 너무도 치장되어 있어 기분이 나빴다. 내 심정은 이렇게나 괴로움을 연기하는 불꽃같은 게 아니다. 끈적하게 불타다가 새까맣게 굳고 마는 용암 같은 것이다.
§.
"받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은걸요."
반딧불이는 거미에게 말했다.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연민하고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주는 턱을 괴고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반딧불이 - 루시올라 라토알리스의 시선이 저 밤하늘과 저 검은 산 능선 중간에 걸려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이미 루시올라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깊이 파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 말고는 그가 그를 기억해 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기록도, 전승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서질 것이라면, 흔적이라도 남길 만큼 그게 부서져서 별처럼 흩어지기라도 하지 그랬어. 죽은 이에게 할 말로 적절한 잔소리를 루시올라는 혼자 읊조렸다.
정원. 물 흐르는 소리.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 촛불들에 둘러싸인 가제보. 어둠에 삼켜져 휴식 그 자체가 된 카지노.
꽃과, 파티션에 얽혀 오르는 덩굴과, 창백한 달빛과,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지고 만 찻잔.
개의치 않던 루시올라는 체념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곧 절단난 신체에 신경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거미는 그것에도 연민했다.
"부서지려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을 숨기려 들었을 것이고, 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너의 빛을 모조리 죽이고 네가 아닌 채로 살아가려 하겠지."
"그것이 나의 바람이라면."
"그것이 너의 친절이니까."
그리 많지도 않은 구름들이 속도를 내어 흐르고 퍼져갔다. 정원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호흡하는 소리보다 근처 풀 잔디가 바람에 쓸리는 소리가 더 무질서했다. 안정. 그러나 그건 과거를 놓지 않고서도 가능한 일이야. 루시올라의 주장이 그러했기에, 그는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다.
빛나는 하얀 브로치. 일렁이는 눈동자는 감추지 못한다.
그 날, 산 뒤쪽으로 불이 치솟아 오르는 장면이 눈에 낙인찍혀 사라지지 않게 되었고, 귀에는 비명이 심해에 가라앉아 파고들어오듯 한가득 차게 되었다. 살면서 그처럼 무력하고 고독했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한계에 임박할 때까지 끓어오르자, 마음이 차게 굳어 식어버렸다. 절망했기 때문이다. 메아리가 넘치는데, 분노와 망설임과 두려움 섞인 네 선명한 절규를, 듣고야 말았다.
서로 손을 잡고 도망을 치라며, 또는 밀어내듯 멀리 보내며 너만은 살라며, 하지만 결국 너나 나나 모두 죽고 말았으면서, 그렇게나 자기를 구하지도 않고 서로 다 그렇게 죽어갔으면서. 바보들.
무력한 약자들이 가장 강하게 타인을 보호하려 했던 그 순간들. 반짝이던 미래들을 버리는데 찰나는 너무 길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도 서둘렀단 말이야.
그 선함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잊지 않기로 했다.
날아오는 화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자는, 그로 인해 자신의 품으로 숨긴 소중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낀다. 그는 그 행복을 원했기에, 나로서는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의미로서 그의 발걸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반딧불이는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과 떨어져야 했다.
그처럼 강렬한 용기에 눈멀어버린 루시올라에게, 오랜 시간 그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한 그 각오의 무게 따위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저 그립고 보고 싶을 뿐이랍니다, 그 새끼가."
도도하고 조그마한 입가는, 또박또박, 그리고 애정 담긴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에 앉아있는 지주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마쳤다.
지주는 진작부터 그에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성되어간다.
'문[文] > 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미 - 앞날이 없는 2200원짜리 대화, 또는 재기 (0) | 2020.04.04 |
|---|---|
| 거미 - 지겹고 처절한 변곡점 (0) | 2020.03.14 |
| 거미 - 48년 묵은 하얀 자책 (0) | 2019.12.05 |
| 와르르르 맨션의 세입자와 건물주 & 재키 (0)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