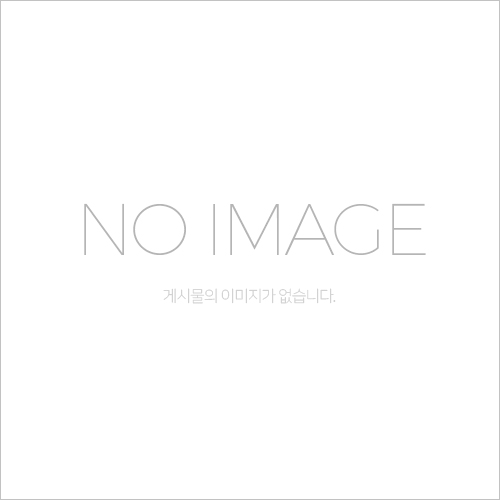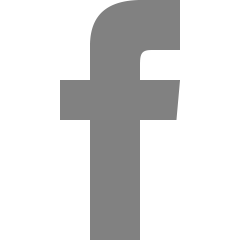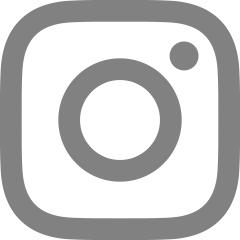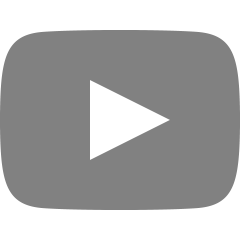거미 - 48년 묵은 하얀 자책

니시모가와*가 넓고 느리게 흐르는 소리를 따라, 강 가장자리에 높이 올라온 길고 긴 축방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무렵.
멀리서 달려가는 전철 소리가 들려와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떠났을 것이다. 입김이 퍼졌다.
자신의 나이를 더는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그가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구트나**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꾸역꾸역 받아들여 삼키자니 심장이 차갑게 식어만 갔다.
젊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어리숙한 치기(稚氣)로 버텨보았겠지만, 뼛속까지 메말라 거죽과 노령만 남아있는 자신을 이제야 보노라니, 말끔하게 타고 남은 자리의 미열만으로도 아파오는 그 허약함의 규모를 종잡을 수 없어 괴로웠던 것이다.
살이란 데고 익으면 감각이 모두 죽기 마련인데, 마음은 그 오랫동안 뜨거운 자책을 잘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차가운 금속 파이프로 만든 값싼 지팡이에 의존한 그가 굽은 허리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로 걸어온 것이다.
처음 전화로 넘어오는 거칠고 쉰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가 그임을 찰나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젊었을 적 점잖은 척하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으름장을 내기를 좋아했다. 그보다 더 어렸을 적부터 그는 집안사람들에게 들어 올려졌다.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을 내리 깔고 보려는 버릇은 그가 정치의 길을 들어서기로 작정했던 30대 초반에도, 사람들을 모아 고함을 치던 중장년 시기에도 이글이글 살아있었다. 독한 가스를 태우고, 시퍼런 불꽃을 뿜어내며 나아갔다.
그러나 - 하아 - 그것이 그가 가진 열정이었다 한다면, 그 열정으로 이룬 것들이란 모두 욕심을 채우는데 쓰이는 진흙이고 그 욕심의 빛깔은 기만에 지나지 않았기에 하염없이 허무할 뿐이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대중의 이름을 거론할 것이었고, 땅을 울리는 발걸음에 피어오르는 먼지마냥 취급하는 그 존재들을 보듬는다고 특필을 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진작에 그의 악취를 거부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 파렴치 끝에 돈줄이 걸려있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의 곁에서 커가는 사람들의 등엔 언제든 그를 내리칠 수 있는 문서들이 쌓여만 갔다.
그러나 그는 싸움꾼이었고, 그는 사람들과 타들어갔다. 서로를 물어뜯을 때마다 뉴스거리가 새어 나왔다. 서로 얼마나 더 추잡한가를 따지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딱딱하게 굳은 미간 조차 파르르 떨리게 만드는 날 선 세계에서 그는 꺾이고 말 것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뒷 통로에서는 농담으로 쓰이곤 했다. 달짝지근한 캔커피로 새벽잠을 이겨내려 했던 당시 기자가 내 옆에 서서는, 자신이 취재해야 할 대상의 그 어처구니없는 행태와 언사를 받아 적어 밥벌이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깨를 축 늘이던 게 생각이 난다.
그러다가, 그 기자가 일을 냈다. 싸지도 않은 그때 당시의 캔커피를 매일 그렇게나 마시더니, 기어코 핵심을 공중에 뿌려 모든 것을 얼려버렸다.
라디오가 토해내는 속보를 듣게 되자 그의 미간은 마치 툭 끊어진 노란 고무줄처럼 힘을 잃었다. "아 시마이네." 그가 한 첫 감상은 이상하리만치 상쾌했다. 긴장이 풀린 입가가 늘어졌다.
하지만 곧 그는 정신을 차리더니 그의 사무실을 뒤엎어버리며 분노를 쏟아냈다. 모든 소란이 터져 나왔고, 그는 형무소로 도망쳤다.
지금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흔을 넘긴 노인에 불과했다.
어느 누구 하나 정도는 알아봄직한데도, 그의 이름값과 존재감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겨울 하늘을 향해 후 불어낸 입김만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이었는지, 잠시 눌러앉던 뜨뜻미지근함 마저 찾을 수가 없었다.
넘쳐흐르는 인터넷 기사 속 짤막한 한 줄이 지금 그가 가진 존재감의 전부였다.
지당한 것이, 앵돌아진 북반구 중심***이 어떻게 제 똑바른 길을 짚어줄 수 있단 말인가. 지극히 순리대로 흐른 결과일 뿐이었다. 유년시절부터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드러나는 징악도 없고, 보이는 권선도 없는 요지경. 그래도 세상 정도 되니 묵묵히 나쁜 놈을 꾸짖는다. 더는 삶에 우회로 따윈 다신 없을 , 남자, 너는 반드시 닥쳐올 정처 없는 여행길 하나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꼬락서니가 되었구나. 그 하얀 눈동자가 바라보는 미래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오****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의 처량한 생애.
자세히 더듬어 무엇하겠어. 그 쓸모없는 개인사를. 나와 당신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지요. 디지털 장의사가 가지는 직업 후유증 정도가 되겠다.
"생각해 보면, 사십팔 년 전 즈음부터 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이제 와서 어찌할까 싶은 회고를 한 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반 줄의 부탁을 들었다. 자신의 기록을 지워달라는 것이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남게 될 기록을 뺀 나머지 개인사와 개인 정보는 모두 지워주어,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가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치기 하면 그만이었을 말이나 하고 있나.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 동정해 주기도 싫은 이 사람.
지팡이 짚은 그 찬 손등을 잠시 잡아주면서, 쉬라고 말해주었다. 아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는 조용히 등지면서 전철역으로 다시 들어갔다.
참고 참다가 그는 선택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으로 내게 기억될 것이다. 내가 그를 지워주기로 했으니, 그는 이제 자신을 자책하기를 그만두고 다소 편해진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자신이 자책했던 일을, 더는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게 될 테니까.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강임
** 구태여 (옛말)
*** 북두칠성이 앵돌아졌다. 딴 길로 벗어져 나가다
**** 갑자기. 느닷없이.
'문[文] > 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미 - 지겹고 처절한 변곡점 (0) | 2020.03.14 |
|---|---|
| 거미 - 1,300 (0) | 2020.01.18 |
| 와르르르 맨션의 세입자와 건물주 & 재키 (0) | 2019.11.25 |
| 거미 - 가난한 재키(Jackie) 수집가 (0) | 2019.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