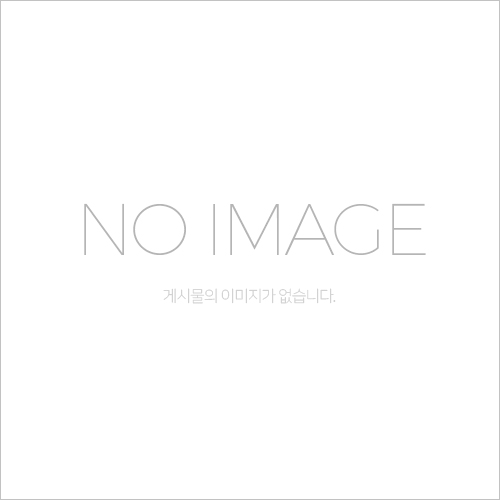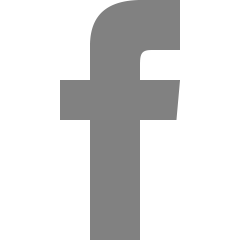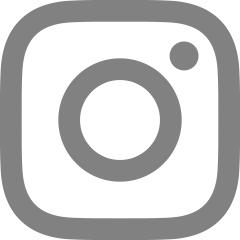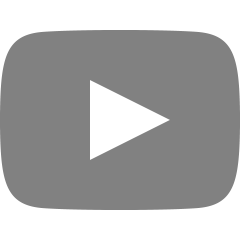Cecil 1-2 (퇴고無)
나는 지금까지도 주변에 비해 그리 좋지 않은 연립주택 한 공간에서 살고있다. 빽빽하게 들어선 책들을 연상케 하는, 암갈색 벽돌로 지어진 테라스 하우스였다. 매 월 벌이가 좋지 못한 나로써는 비와 바람을 피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말고 들어가야 했다.
방 하나라도 빌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낼걸 그랬나 하고 마음을 바꿨던 건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와서였다. 내 전재산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
퀴퀴한 먼지가 자욱했지만 다행히 곰팡이는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지만. 꼭대기 층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돈이 없었으니까. 굳이 자취를 핑계로 둘 필요도 없었다.
우리집이 망하여 쫒겨난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모두 흩어진 뒤로, 나는 줄곧 혼자서 모든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돈도, 먹을 것도, 잠 잘곳도, 씻는 것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던 지난 날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왠지 좀 서러워졌다. 눅눅해지는 집 안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발을 동동 굴러 집 전체를 진동 시키지도 못해 더 울화가 치밀었다.
그럴 때마다 새벽에 나가 빗소리를 방음벽으로 삼고는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욕은 하지 않았다. 숙녀로서, 그정도는 용납할 수 없었다.
흠뻑 젖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가는 꼴을 보였다가는 쫒겨날지도 모르므로, 최대한 집 입구 쪽으로 붙어 튀어나온 것 같지도 않은 현관 지붕 아래에 서서 몸에 닿아 흐르는 물기를 빼내고 들어가곤 했다. 고여있는 물에 가로등 빛이 일렁였다.
그러나 사실, 집 주인 아주머니는 이런 내 기괴한 행동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때 묘하게 타버린 베이컨에서 심술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주머니 남편께선 옆에서 신문을 보다가 시선을 힐끗 한번 주시고는 끌끌 하고 웃으시곤 했다.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니까. 나는 식탁 앞에 고개를 숙이고는 기도를 올렸다.
아저씨는 대체적으로 유순한 성격인 반면에, 아주머니는 그렇지 못했다. 살림으로인해 불어 오른 통통한 몸집은 꽤나 박력이 있어서, 언제나 나를 작고 초라해지게 만들었다. 그런 성격에 깐깐함까지 돋보인다. 깨끗한걸 좋아하시니, 나도 집을 잘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이 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왜 그리도 형편없이 내버려 두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도통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요리는 맛있다. 깐깐함은 곧 섬세함이니까. 다른 의미로 흰색 앞치마가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었다. 아가씨 시절 사진이 조작같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에 있다.
아무튼.
난 그렇게 이곳에서 7년을 살고 있다. 이 마을에 나를 묻으리라 생각한건 약 5년 전이었고, 난 이 마을이 좋았다. 엄마같은 아주머니에, 아빠같은 아저씨. 맛있는 식사. 어찌 되었는 존재하는 나만의 공간. 환기만 시켜준다면 그럭저럭 살만한 내 집. 작은 부엌과 거실이 전부인, 내 공간. 이 모든것이 내게 주어진 재산이었다.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하며, 나는 매일 생각하다 잠이 들었다. 그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곤 했다. 당시로서는 난 나를 상당히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다. 이만큼 해 냈잖아. 17세 소녀로서는 대단한 근성이다, 난 잘해내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곧 잘 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웠을 때 뿐이었다.
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에서, 여기서마저 현실에 지쳐 우울해 있는건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일까. 난 매일 대체적으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까지는, 5년동안, 그랬다.
내 기억속에는 나의 삶만 기록되어 있는줄 알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후에 곧장 알게 되었고.
아직도 그 숨막힘은 잊을 수 없다. 목 속에서부터 뜨거워져서, 모든것이 다 타버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
맙소사. 네가 없어지는구나. 기가 차다.
……그렇게, 그가 내 인생에 그렇게나 깊숙히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사실 난 홀로 모든것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날 지탱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후로, 비로소 나는 정말로 혼자 서게 된 것이다.
난로 선반 위에서 얌전히 흔들리는 촛불과 난로가 어두운 방에 빛을 뿌렸다. 나는 더글러스의 맞은편에 앉은 채, 그의 깊고 예리한 눈매 끝을 보며 생각했다.
그러고보니, 이 사람이 내 기억에서 없었던 적은, 지난 7년 동안 단 2년 뿐이었구나.
그리웠다. 정말로.
밀크티가 달달한 새벽 3시. 아직도 비는 하염없이 쏟아졌다.
======================
7년 전 - 가족이 흩어지고, 혼자 살게 됨.
5년 전 - 이 마을이 좋아짐. 더글러스를 만남.
2년 전 - 더글러스 사라짐.
현재 - 더글러스 돌아옴. 소피아 (Sophia) 나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