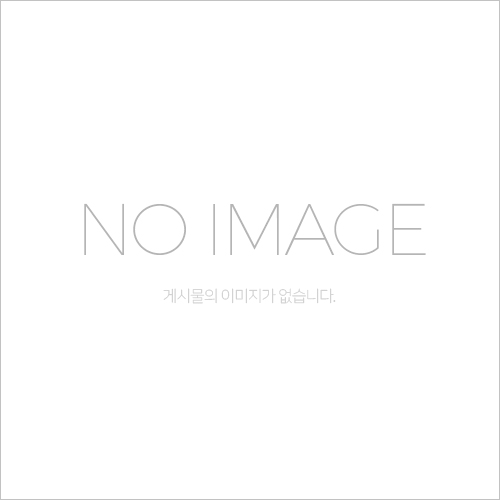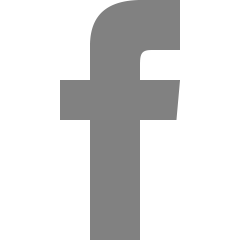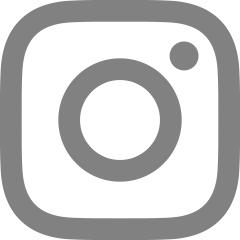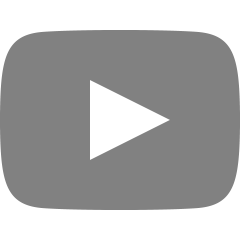20200319 일기 - 키친

요시모토 바나나, 라는 작가명에 처음 눈길이 끌려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빌렸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밀려오는 어떤 벅차고 놀라운 낯섦에 와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본 이후로부터 무슨 소설이든 키친을 잣대로 평가하는 몹쓸 습관이 생기고 말았다. 하지만 난 이 습관을 좋아한다.
한번에 술술 읽힌 기억이 별로 없는 소설이다. 아니, 키친이라는 책은 단편으로 된 총 세 작품이 들어있는 소설집이다.
가령 이런 문장들 때문에 물 흐르듯 읽기가 어렵다.
"
마음으로 조금씩 빛과 바람이 통하여, 기뻤다.
"
"
방 한 구석에서 숨쉬며 살아 있는, 밀려오는 그 소름 끼치는 고적함, ....
"
"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말하는데, 질주한 것은 내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난 그 모든 것이 진정 슬픈걸.
"
첫번째. 주인공의 감정 묘사를 소화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하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한 서술이 있은 후에, 그로인한 주인공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중간 묘사가 없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낙엽이 바람을 타고 떠나. 스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 부산스러움 속에서 나는 외로웠다." 이런식의 묘사라고 해야 하나.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자신은 적막 속에 홀로 있는 듯한 감정으로 더욱 외로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만다는 식의 중간 묘사라던가가 없다. 아니, 이것도 예시로 들었지만 제대로 된 예가 아닌 것 같다. 아휴 설명을 못하겠다.
이 책에 들어있는 소설엔 반점이 많다. 그래서 읽다보면 매번 숨 한번 고르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
단숨에 읽는다던가, 속도를 낸다던가 하는게 어렵다. 왜냐하면 작가가 반점을 쓴 곳에서, 등장인물이 잠시 묘사를 쉬고 호흡을 정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의미 없이 문장을 끊었을리 없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반점을 넣었겠지.
그런데 그 반점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나는 그 반점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마도. 정말 아마도.
가령, 같은 문장이라도 "마음으로 조금씩 빛과 바람이 통하여 기뻤다"라고 적혀 있을 때보다 "마음으로 조금씩 빛과 바람이 통하여, 기뻤다"라고 적혀 있을 때 등장인물의 감정이 더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스며드는 기분을 받는다.
이런 효과를 체험하고 난 후로, 나는 글을 쓸 때 반점을 많이 쓰게 되었다. 하지만 내 글은 아직도 반점으로 인해 호흡이 어중간하게 끊긴다. 키친의 완성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사실 ㅋㅋ..
그냥 하고싶은 말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하지 않은데.
요컨대 그런거다.
나는 키친이라는 책을 구석하는 모든 문장들이 내게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느낌으로도 그렇고.
가령 이런 거.
"귓속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별들 소리가 들릴 것처럼 잠잠하고 고독한 밤이다. 파삭파삭한 마음에 컵 한 잔의 물이 스민다."
ㅡ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는 등장인물.
"투명하게 가라앉은 시간이 볼펜 소리와 함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ㅡ 이사했다고 엽서를 쓰고 있는 조용한 지금을 묘사하는 등장인물.
나는 이 책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더이상 학교 도서실에서 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고로 구입했다.
그리고 내가 잠수 생활을 하던 때에 잊어버렸다.
그리고, 헌책방에서 그 많은 책들을 다 뒤집어놓지 않고도 단번에 책을 발견해 냈다.
찾았을 때, 숨을 덜컥 들이 마셨던 것 같다. 소리 치고 싶었는데 그럴수 앖었거든. 나는 무척 기뻤다. 키친은 어쩔 수 없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나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한다.
피에스. 당시 국어 선생님은 이 책이 어려운 책이라며 어떻게 읽게 되었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역시 어려운 책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개의 단편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로 묶으려 했던 내 머릿속도 그렇고, 좀처럼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 낯선 묘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디선가 모르는 그 차분하고 투명한 느낌이 있는데. 천천히 읽게 되는데(반점 때문에도 있지만).
피에스2. 사진에 있는 그 외의 책들도 모두 중고책방에서 사온 것들이다. 그중 문고본 "어느 하늘 밑"이랑 "달과 6펜스"는 기대하며 읽는 중이다. 어느 하늘 밑이라는 책은 1977년에 초반 된 책인데, 이 책의 뒤에는 구입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았다.
"2.28 파르코에서. 책 사서 오니 O.P가 기다리고 있었다. "
" * 부럽다. 글 전체가 나의 부러움!"
작가의 글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니. 그 사실이 부러웠다. 대단한 찬사 아닌가.
'비문[非文]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0506 - 11,000 (0) | 2020.05.06 |
|---|---|
|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공개 연기 (0) | 2020.04.07 |
| 2019년에 7,514km를 돌아다녔대. (0) | 2020.01.11 |
| 20200101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