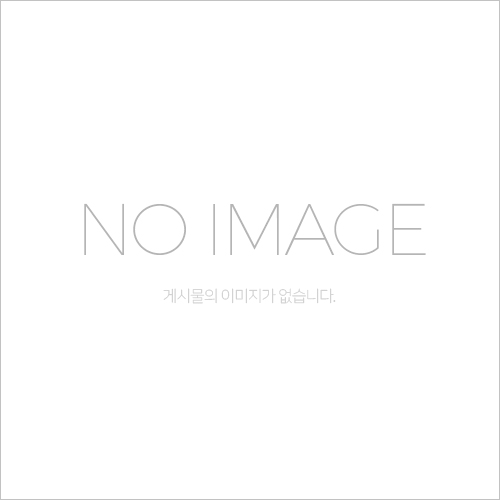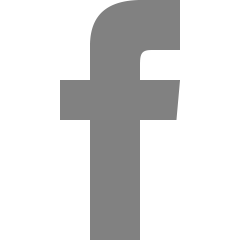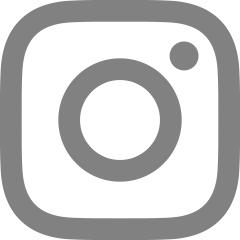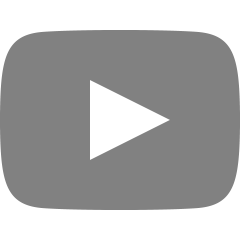거미 - 100

100
오래전에 거처로 사용했던 작은 오두막을 찾아갔다. 지금 있는 집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곳은 산모기도 많지만 고즈넉한 개울물이 흐르고 한적한 공기가 맑은 곳이다.
모처럼 이곳을 들르기로 한 이유는, 지금도 확실치 않았다. 명확하게 정한 바도 없었다. 목적성 있는 여행 같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들을 일단 뒤로 미뤄두고 떠나는 종류의 이동이었다. 일단 떠나고 보는. 잠깐의 피신 정도.
무엇으로부터 피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뿌연 상황.
하필 왜 이곳을? 그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러 장소들 중에서 유독 이곳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한 곳이 이 곳 한 곳만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런 것도 아닌데. 허름한 빌라를 내게 주었던 할머니의 묘에 가지 않은지도 조금 지나지 않았는가. 그 무덤에 의미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게는 의미가 있었으니 이따금 그리워서 찾아갈 법도 한데. 외로울 때나 찾아간다니. 그건 좀 이기적이긴 하네.
그러니, 내가 이곳에 찾아온 건 그저 오랫동안 방치된 이곳이 마음에 걸려서만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외롭기만 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면, 각각의 시간에는 사건이라는 기점이 흔적으로서 남는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 역사라고 부르곤 한다.
헌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역사의 당사자나 그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사라진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 결국 그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의 후대이거나, 그 흔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일 것이다. 경험이나 피부로 아는 바가 아닌, 정보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이 전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 '역사의 당사자'라는 표현에 나 같은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 이런 때에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껴 있기가 불편해진다. 섞여 들어가기엔 면목이 없어지는 기분이다.
죽어서, 피가 혈관에 갇혀, 멈추어, 고여 있는, 검푸른,
100일째 되는 날. 오늘.
이곳을 들르기로 했다. 한 주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지만,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막연한 것이다.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새삼스러운 날은, 유독 그 날의 의미가 그 하루에 스며들어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일기를 쓰는 사람에게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면 좋았을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부터 죄책감이 몰려온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이런 생각이 덧붙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즈음에 오두막에 도착했다. 얼마 남지 않은 다섯 가지 정색(正色)이 벽과 서까래와 보에 찢긴 조각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눅눅한 공기 탓인지 지붕 기와가 더 새까맣게 보였다.
땀이 흐르지는 않았다. 가볍게 숨이 찼다.
오두막 안은 먼지로 한가득. 다른 거미들이 자신들의 집을 펼쳐놓고는 모두 떠났다.
내가 떠났듯이, 이들도.
하지만 나는 잠깐 돌아왔다. 아주 스치듯 들렀을 뿐이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스쳐 지나간 그 무엇도 잊지 않고 있었다. 지난 세월 모든 날동안 그러했고, 지금도 그럴 생각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곳도 그런 곳이구나.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증발되지 않는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비록 슬픈 날도 쌓여가지만, 그것 또한 시간 중의 흔적이라고 본다면 흔적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건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건물의 색깔처럼, 사라지지만 않아준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생각이다.
버스 유리에 머리를 기대고 잔상처럼 지나가던 나무들 끝을 쳐다보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착하자마자 나자빠져서 펑펑 울어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게 계획대로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만.
그리고 결국 망쳤다. 몸이 지쳐서 기운이 없다. 조금 이따가 울어야지. 등에 매고 있던 배낭을 내리고 방구석에 적당히 던져 놓았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환풍시키기 위해 열 수 있는 문들은 모두 열어놓았다.
다시 나와보니, 빗방울이 본격적으로 토도독 하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날 한 날을 세어와 어느덧 온 날을 맞이 한 눈물의 날. 숨어서 온갖 청승 부리기 좋은 날. 습한 한숨 조용히 몰아 쉬면서, 개울물 소리에도 묻힐 자그마한 훌쩍거림에 어깨를 떨다가,
이윽고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두막 앞 낮은 나무 계단에 앉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이 젖어들어갔다. 숲도 그러했다. 개울이 점차 시끄러워져 갔다. 잎사귀를 때리는 소리와 멀리서 은은하게 퍼져오는 개구리 우는 소리. 신발을 벗었다. 빗물에 적시고 싶지 않았다. 맨발로 땅을 디뎠다.
하늘 새까만 것 좀 봐라. 쉽게 그칠 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울적한 기분 그 이상으로 괴롭지는 않았다. 조금 더 부풀면 터지려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쏟아지려나. 지금은 아직 이른 것 같지만.
그래서, 비나 좀 더 맞기로 했다. 무릎을 껴안고 웅크렸다.
"어쨌든, 오늘은 결국 슬프고 괴로운 날을 대표하지만, 가 내게 슬프고 괴로운 대상인 건 아니니까."
산 구석구석에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바로 눈 앞에서도 물안개가 바람 따라 흘러갔다. 부드러운 천둥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잊지 않고 있어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
결국, 내가 아픈 건 어디까지나 참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건 견딜 수 있는 괴로움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일 뿐이다.
'문[文] > 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미 - 200 (초고) (0) | 2019.10.25 |
|---|---|
| 거미 - 1,729,440 (0) | 2019.10.11 |
| 거미 - 26,664 (0) | 2019.07.10 |
| 거미 adv - 배경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