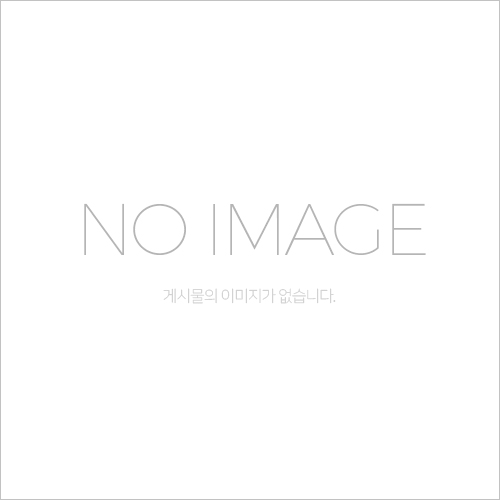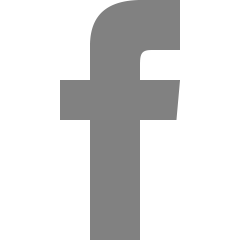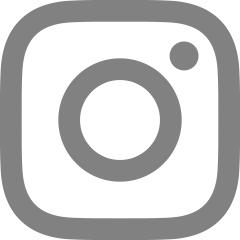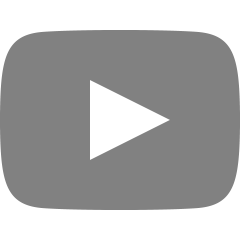Cecil 2
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보통 비가 자주 오지만, 오늘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던 것일까. 뽀송한 공기 속에서, 포근한 부드러움이 달콤한 채로 나는 눈을 떴다.
이불은 왜 이토록 사람을 끌어들이는걸까. 몸을 뒤척이면서, 어깨를 제대로 덮지 못하는 이불을 끌어 당겼다. 기지개를 켜는 팔과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창문을 등지며 나는 반쯤 눈을 떴다.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눈동자가 주변것들을 보여주었다.
어디선가 주워왔던, 짝을 잃은 식탁 의자 앞에 서서 상체를 벗은 채 팔을 돌리며 몸을 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하얗게 빛나는 금빛이 눈부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세련되고 날카로운 얼굴 선이 멋지다. 근육이 크게 부풀지 않았지만 내실이 분명 탄탄하리라 생각되는 등근육과 팔근육도 보인다. 슬슬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따가운 듯 하여 잠시 눈을 감았다. 마지막에 눈에 들어온 그의 다리선이 상당했다.
창가로 몸을 돌렸다. 소리 지를 뻔했다. 잠이 확 깼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아아.. 미안."
등 뒤에서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느긋한 구두 소리가 울리더니, 그가 옷을 입는 소리도 따라 들려왔다.
"이제 됐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다시 몸을 돌려 일어났다. 이불로 온 몸을 두른 채로, 눈만 내 놓은 채로 그를 바라 보았다. 흰 셔츠를 입고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 시선이 꽂힌다.
이런 아침은 내게 너무 과하다.
"잘잤어?"
무표정의 그가 물었다. 나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가 이 방에서 자야 했는지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른 방을 빌릴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숙면을 취해버린 나의 이 무신경함과 나태함은 누군가가 징계를 해 주면 좋겠다. 남자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손님으로 접대해 주지 못했음이 두번째이다.
"나가 있을게. 옷 갈아 입어."
그의 말이 떨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 썼어야 했을까. 아니면 두 눈을 비벼야 했을까. 그는 미미하게 웃고는 방 문을 열고 나갔다.
시간은 8시.
말했지만, 상당히 좋은 날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