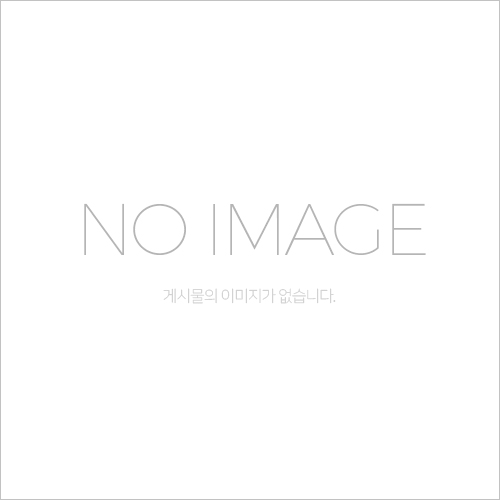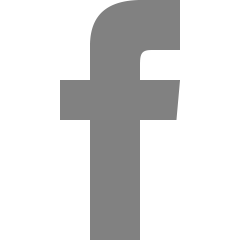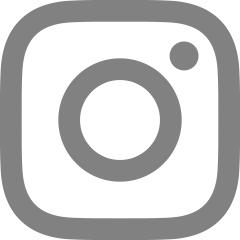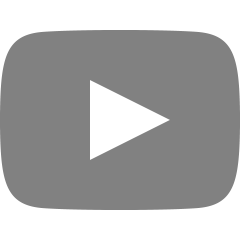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C]arbon
연필이 굴러가는 소리가 방에 울렸다.
연필은 잠시후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춘것은 자연의 힘으로 그리 된 것일 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의 길을 막지 않았다.
녀석은 저 위 검은 책상 위에서 떨어졌다. 무거운 원목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책상으로, 사장님들 앞에나 있을법한 웅장한 사이즈의 책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위는 허전했다. 종이 한장에 엎어져 있는 한 남자가 매마른 눈을 뜬 채 벽이나 쳐다보고 있다. 나무놀이를 하는것 같다.
흑백과 회색빛의 색 없는 방 안. 그레이한 우중충함이 그곳에 한가득.
연필로서는 그렇게밖에 그릴 수 없는, 색깔 없는 세계.
그런 연필이 색깔을 만드는데에는 약간의 힘이 필요했다. 연필심이 부러져 있었다.
그러고보니 그는 살아있을 적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평상시대로."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리 하기로 했다. 그는 평상시를 살던 사람이었다. 이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열심히 일이나 하는 사람이었다. 회색빛 건물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 그저 살던대로 살면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세계가 이렇게나 맛 없던 곳이던가. 탄소덩어리에 혀가 매마르는 듯한 분위기에 그 자신도 말라간다. 그것을 실감하니, 그는 평상시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었다.
맙소사. 사막보다 더 건조하다. 이건 오히려 바싹 타는 것 같다. 물이 없어서 타고 있다. 산화된다. 새까맣게.
그 가운데에 자신이 있다. 마음이 다 타서 새까맣게 재가 되었다.
그렇게 며칠씩이나 있었다. 설마 했지. 행여나 색이 돌아올까 싶었다. 돌아오지 않는걸 자각한건 언제였을까.
그래서 연필로 자신의 손을 찔러본 것이다. 살이 두툼한 부분을 찔렀더니 피가 나왔다. 빨간 핏방울이 하얀 종이 위에 떨어졌다. 새빨간 자신을 보고는,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런데, 안심하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져 쓰러졌다. 죽었다.
시간이 지났다. 피도 새까맣게 변했다. 사실 그 방, 그 도시 내에서 가장 새까만 검정이 되었다.
회색의 방에서 매마른 눈이 벽이나 쳐다보고 있다.
연필이 멈춰 있다.
분명 평상시대로이길 바랐는데.
'문[文] > 단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arbon 3 (0) | 2014.05.29 |
|---|---|
| [C]arbon 2 (0) | 2014.05.28 |
| 톱니바퀴 구르는 모래소리 (1차) (0) | 2014.05.07 |
| 상처론 (0) | 201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