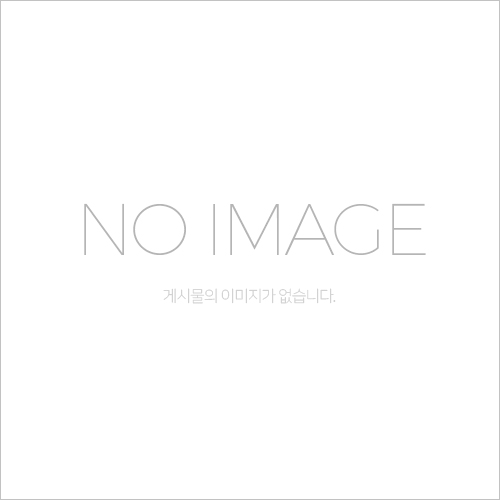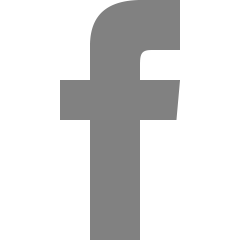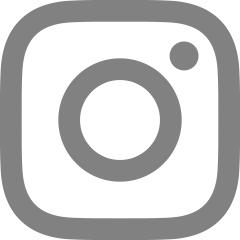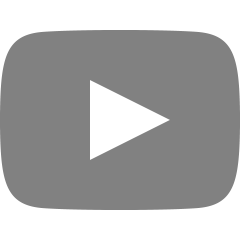거미 - 2
거 미 2
무릇 새벽은 피부가 곤두서게 서늘한 법이다. 얼굴을 스치는 냉기에 정신이 들었다. 잠이 들어있던 만큼 체온을 잃었으니,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파고 들었다.
돌아다닐 사람도 없을 터인데, 누런 가로등 빛 아래에 무엇인가를 보기라도 했는지 멀찍이서 개가 짖는다. 그 소리가 밤하늘 아래,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때때로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경쟁이라도 하는 듯 싶었다.
벽걸이 시계의, 공기를 저미는 소리만큼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물을 마시고싶어 일어났다. 징그러운 팔들을 들어 기지개를 켰다. 등에서부터 손끝까지 뼈가 제자리를 찾는 듯한 소리가 났다. 배를 긁적이고는 자리에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아침이 되려면 아직 좀 더 고요해야 하나? 저 산 뒷쪽 깊숙이 해가 기어올라오고 있을것인데, 그 기운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햇살이 어둠을 맑게 하여 푸른 새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간대가 가장 어둡다고 인간들은 말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터이다.
예전엔 이런 식으로 지금의 밤 시간을 가늠했다. 대충 네 시 정도 되었겠구나. 이 시간에 일어났구나.
물 한잔 마시니 몸 속에서 한기가 스며들듯 퍼져가는 게 느껴졌다. 부르르 떨고는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가 이불 위에 털썩 앉았다. 모처럼 일어났는데 책이라도 읽을까. 이 시간에 TV에서는 뭘 방송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나 했다. 유독 정신이 맑을 때의 새벽은 마치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싶을때 만큼이나 유혹적이다. 그 시간이 무던히 지나간다는 게 매우 아까울 때가 있다. 잠들고 싶지 않다. 늦잠 자고 싶어하는 어린애 마냥.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휴대폰 충전 잭 램프에 시선이 멈추었는데, 지금 보니 문자 알림이 반짝이고 있었다.
손을 뻗어 폰을 쥐고 화면을 보았다. 쨍 하고 눈이 부셨고, 그걸 견디며 문자를 확인했다. 남자였구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샤워한 뒤, 늦은 저녁을 대충 때우고 이불에 철퍼덕 누워 잠들었을때까지만해도 눈에 거슬리는 빨간 점등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문자 도착 시간을 보니까 오전 1시였다.
오전 1시¨¨¨. 이 인간은 세시간 전에 왜 문자를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조림이¨¨¨ 너무 짜게 됐어요. 아침에 나눠드릴 테니까 잠깐 일어 나서 받으셔요."
잠깐 허공을 바라보았다.
장조림.
실패한 장조림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오전 1시에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맛있어서 나눠주겠다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아무리 늦게 자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거미줄 관리를 해야 했던 시절의 버릇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멋대로 눈을 뜨고마는 나인데. 수리할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일을 시작하던 버릇때문에 멋대로 몸을 일으키는데! 그런 내게 아침에 본인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장조림을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 아저씨. 내일 내가 깨워줘야지."
나는 이 무례한 남자에게 자비로운 친절을 나타내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다. 이불 속은 금새 식어 있었다. 더욱 그 속으로 파고들며 몸을 웅크렸다. 비몽사몽으로 눈을 비비는 그 남자의 맹한 얼굴을 보는게 조금 기대 된다.
뭐라 얘기하며 깨울까.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전화를 할까. 얼굴을 보면 어떤 말로 비아냥 거려볼까. 오히려 친절하게 웃어주면서 '늦잠 주무셨네요'라고 말해줄까. 장조림을 담을 통을 불쑥 내밀어볼까.
어느 상황이 재미있을까. 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을 것이다. 푸근한 새벽이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요즘에는 이런것 마저 조금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푸근한 새벽이었다.